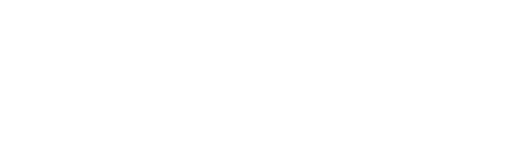7.3%. 이 숫자가 우리 미술의 현주소다. 한국인 중 1년에 단 한번이라도 미술 전시를 찾는 관람객 비율이다. 이들마저도 대부분 1회 방문에 그친다. 연간 4회 이상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은 0.8%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3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그렇다. 팬데믹이 끝났지만, 전시 관람률은 좀처럼 늘지 않는다. 1년간 전국의 전시 관람객 수를 다 합쳐도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 수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
미술 전시가 소수의 별난 취향으로 보이는 시대에, 관람객이 매년 늘어나는 전시가 있다. 매해 가을마다 서울 노원구 당현천에서 열리는 공공미술전시 ‘노원달빛산책’이다. 이 전시축제 관람객은 2022년 46만명, 2023년 96만명에 이어 지난해 122만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작은 지역 행사로 시작해 5년 만에 대규모 미술제가 되었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전시를 전혀 보지 않는 92.7%의 비관람층을 겨냥해 전시를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야간 공공미술이라는 정체성은 이러한 전략의 정점에 서 있다.
모두를 위한 전시여야 관람객이 찾아온다. 노원달빛산책은 모든 동선에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게끔 했으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택시 승강장을 두고, 출입로를 개선해 물리적 장벽을 없앴다. 야간 전시에 수반되는 조명은 노년층의 빛 인식 범위까지 고려해 설계했다. 바닥의 안전 조명은 기능적 필요를 넘어 아예 예술작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더니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이나 유아차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이 대폭 늘었다.
또 작품 소개에 가급적 쉬운 말을 썼다. 전체 인구 4분의 1을 차지하는 어린이, 경계선 지능인, 이주민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전문 용어를 의도적으로 뺐다. 그리고 주민 도슨트 프로그램으로 전시의 포용성을 넓혔다. 외국어와 수화에 능통한 지역 주민들이 전시를 안내하고 함께 작품을 감상하면서, 전시 공간을 친근한 커뮤니티 모임 장소로 만들었다.
일부 작품은 지역 주민이 주제와 내용, 형태까지 직접 결정한다. 6주간 토론을 거쳐 합의한 작품을 예술가에게 공동으로 의뢰해 제작한다. 이렇게 만든 작품은 자연스럽게 지역의 정체성과 공통 관심사를 담게 되고, 주민의 애착 대상이 된다. 전시 후 남은 작품은 주민이 스스로 그리고 공동으로 관리한다. 계속해서 이웃을 연결하는 매개가 되는 것이다.
노원달빛산책은 전시를 매일 밤 10시까지 운영해왔다. 퇴근 뒤에야 전시를 볼 수 있는 다수 시민에 맞춘 시간대 설정이다. 영화나 공연처럼 전시도 당연히 밤에 볼 수 있어야 한다. 외국과 달리 이른 시간에 전시를 마치는 미술계의 관행이 바뀌었으면 한다.
한국의 낮은 전시 관람률은 미술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시는 사회를 닮는다. 사람들이 보러 갈 수 없는 시간에 열고, 관람객의 접근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작품을 만들어 제시하고, 난해한 언어로 설명하는 전시는 민주주의의 외양을 한 권위주의 사회의 산물이다. 전시기획자는 그것을 바꾸는 사람이어야 한다.
.
손이상 | 2022-2024 노원달빛산책 기획감독
.
한겨레 hanidigitalnews@hani.co.kr
.
.
.
기사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0745?sid=110